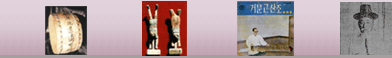|
 |
○ 이는 노재명 집필 『꽃피는 중고제 판소리』 서적(충남문화재단·국악음반박물관 편, 서울:도서출판 채륜, 2016년) 164~166쪽에 실린 글.
○ 상기 사진 설명: 국악음반박물관 소장 자료.
* 노재명 설치미술 ‘판소리 3’(충북 중고제 복원에 힘쓰고 있는 조동언 명창과 충북 가야금산조·병창·판소리의 명인 박팔괘를 표현한 작품)
* 완성: 2016년 8월 23~24일.
* 재료: 한지, 골판지, 오랜 세월 자라며 네 모서리가 서로 붙은 나무, 붓, 철사 등.
* 크기: 가로 52cm, 세로 47cm, 폭 15cm.
* 작품 설명: 왼쪽부터 차례로 충북 가야금산조·병창·판소리의 명인 박팔괘 초상화(사진이 아직 발견되지 않아 박팔괘 녹음을 오래 들은 느낌 + 충청도 명창 이동백 갓 사진 + 서산 마애삼존불 얼굴을 참고하여 상상으로 그림), 충북 중고제 복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조동언 명창 판소리 모습 인형.
가야금산조·병창·판소리의 명인 박팔괘
글/노재명(국악음반박물관 관장)
충청북도 청원 출신의 국악 명인 박팔괘는 구한말~일제시대 가야금산조와 병창으로 큰 활약을 하였는데 가야금을 병행한 판소리의 눈대목 창을 했다면 이 명인 또한 판소리를 응당 할 줄 알았을 것이다.
박팔괘는 특히 가야금병창으로 명성이 자자했고 역대 여러 명인들의 가야금병창 녹음을 모두 통틀어서 가장 압도적으로 뛰어난 기량을 보여준다. 우선 성음이 여타 가야금병창 명인들보다 좋고 가야금 실력 또한 능숙하다.
그런데 박팔괘 명인의 가야금병창 녹음을 들어보면 가야금을 병행하지 않은 판소리로 활동하기에는 목 기량이 당대 판소리 전문 명창들에 견주어 다소 부족함이 있는 목 상태라고 판단된다. 당대에 워낙 탁월한 판소리 명창들이 많았고 그래서 박팔괘는 판소리를 할 수는 있었으나 판소리 명창으로 행세하지 않고 본인이 특색있게 누구보다 잘할 수 있었던 가야금병창에 주력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하여 박팔괘는 가야금병창 최고봉 수준에 올랐고 충청북도의 대표적인 국악 명인으로 오늘날 회고되고 있다.
박팔괘의 생몰연대는 일설엔 1882~1940년이라고 알려져 있으나(장사훈 저서 『국악 개요』 서울:정연사, 1961년 / 장사훈·한만영 저서 『국악 개론』 서울:한국국악학회, 1975년 등) 조선시대 후기에 출생해서 광복 직후까지 생존했다고도 한다.(이진원, “박팔괘의 가야금병창 유성기음반 취입” 국악음반박물관 편 『판소리 명창 제6호 - 20세기 초반 명창 소리를 만나다』 서울:채륜, 2016년, 85쪽)
박팔괘와 그의 당질인 가야금 명인 박덕수, 그리고 박팔괘와 박덕수에게 가야금을 배운 충청남도 연기 출신의 국악 명인 박상근 등 이 충청도 박씨 가문에서 판소리 하는 이가 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국악음반박물관 소장 악기 가운데 ‘충청북도 청주군 청주읍 박행충’이라고 붓글씨로 표면에 기록된 소리북이 있다. 이는 1931~1946년 무렵에 제작된 것으로서 소리북에 이같이 지명과 사람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예는 극히 드물다. 청주 지역에서 활동한 박씨 광대라면 박행충은 박팔괘의 일가일 가능성도 있다.
박팔괘는 1906년과 1915년 가야금병창 유성기음반을 취입한 바 있는데 1906년 음반에는 청주 율객, 1915년 음반에는 충청도 가객으로 기록되어 있다.
충북 호걸제, 중고제 계통의 옛 국악인 가운데 박팔괘는 유일하게 유성기음반을 남긴 명인이고 인물 사진을 충분히 촬영하였을 시기에 활동하였으나 박팔괘의 인물 사진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박팔괘의 가야금병창과 견주어 볼 수 있는 중고제 계열의 가야금병창 녹음으로는 경기도 이천 명창 신경봉이 1906년에 취입한 가야금병창 단가 <노인가>를 꼽을 수 있다. 이 녹음을 들어보면 신경봉 명창은 전라도 명창들보다는 충청도 박팔괘, 심정순 명창에 가까운 발성을 썼다고 판단된다. 신경봉 명창은 성음이 쉰 목소리가 아닌 청아하며 발발성이 약간 있고 고음이 아주 탁월하진 않으나 중저음이 좋다.
이 <노인가>를 비롯해서 1906년에 신경봉, 박팔괘 명창이 남긴 음원은 가야금병창 분야 최초의 녹음이다. 박팔괘, 신경봉 모두 중고제 계통의 명창들이고 전통사회 경기 충청도 중고제 지역에서는 중고제 판소리 독창뿐 아니라 이러한 가야금병창도 각광을 받았다. 박팔괘, 신경봉의 가야금병창 녹음이 바로 그러한 흐름에서 취입된 결과물이라고 하겠다.
심정순은 1911년에 <노인가> 유성기음반을 취입한 바 있고 <노인가>는 경기 충청도 중고제 계열의 명창들이 즐겨 부른 인기곡이었다. 이 단가는 중고제 지역의 <백발가>라고 칭할 수 있을 만한 사설로 되어 있다.
1915년 남도민요 <새타령>, <육자배기>를 유성기음반에 취입한 신경연 명창은 음반에 전라도 가객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신경연은 동편제 판소리 명창 장판개의 친매부이다. 신경봉, 신경연 명창은 형제, 또는 사촌쯤 되는 것으로 짐작된다.(노재명, “‘20세기 초반 명창 소리를 만나다-송만갑·신경봉·오태선·이동백·신경연’ CD 음악 분석·해설” 국악음반박물관 편 『판소리 명창 제6호 - 20세기 초반 명창 소리를 만나다』 서울:채륜, 2016년, 397~398, 402~403쪽)
1915년 3월 14일자 『매일신보』에 “박팔괘 죽고 송만갑이 담배질에 뼈만 남고 김창환이 김봉문이 관밖 송장이 다 되고”라는 기록이 있다. 당시 박팔괘는 생존해 있었으므로 이 기록은 오류이거나 박팔괘 국악 활동이 예전 같지 않다는 표현인 것으로 보인다.
|
| 2016-12-07 |
|